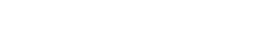<비렁길 3> 기행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종희 조회 563회 작성일 23-10-20 14:49본문
추석 연휴가 늘어나면서 형제들과 고향행이 급하게 진행되었다. 실시간 교통 정보가 아무리 정확해도 고속도로와 국도의 속도는 거북이걸음이다. 허기와 기다림의 고개를 견디며 출발한 지 14시간 30분 만에 고향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밤늦게서야 얼큰해진 우리는 아이들과 동네 산책길에 나선다. 명절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막한 공기가 흐르는데, 보름달은 온화한 표정이다.
이튿날 성묘를 마치고, 비렁길 3코스 얘기를 꺼냈다.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다녀오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내 말에 끄덕이는 동생과 조카, 그리고 딸아이와 넷이서 직포를 향한다. 차가 거의 비렁길 입구에 다다르자 어제 여객선에서 만난 친구가 거의 풀린 상태로 걸어온다. 고향이 금오도이면서 비렁길을 한 번도 다녀간 적이 없어 아이들과 큰 마음먹고 내려왔다는 그 친구의 첫마디는 "아이고 너무 힘들어~"이다. 이 말에 동요될까 봐 "학동에서 거꾸로 걸어와서 힘든가 보다"라며 아이들을 안심시킨다.
비렁길 3코스는 처음부터 계단이다.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배운 데로 상채를 앞으로 숙이고 계단의 끄트머리를 밟고 오르니, 그다지 힘들지 않게 흙길을 밟는다. 여기저기 초록의 기세가 꺾이는 것이 역력한데, 동백나무 아치 터널은 예전보다 더욱 또렷한 얼굴로 마중한다. 가느다란 길들이 오르막과 평지를 넘나들고,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우리의 걸음은 멈춘다. 멈추자마자 짙은 초록 천장이 열리고 한쪽 귀퉁이를 채운 노란 칡잎이 반긴다. 이런 걸 만나기 위해 나는 자주 시나브로에 젖어드는지 모른다. 산행을 하다가 땅만 보고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다. 언젠가 한 무리의 야생마 걸음이 허연 먼지를 매달고 순간 이동을 하는 걸 목격한 후로, 산악회 가입의 미련을 완전히 버렸다.
이윽고 도착한 갈바람통 전망대에서 마치 여기가 끝인 것처럼 꽉 채운 풍경을 담는다. 시간은 느릿한 오후의 중심에 서고, 바다는 태양에게 제 몸을 아낌없이 내놓으며 수평선을 지우고 있다. 물빛이 너무 예쁘다는 조카의 탄성은 멈추지 않는다. 9년 전에 본 신비로운 색채를 망각했다면 오늘에 만족하는, 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얼마 전 습득한 내 지적 허영심은 실력 발휘를 한다. 갈바람 통이 참 고마운 자연 방파제라는 말도 빼먹지 않는다. 하지만 갈바람통은 어쩌다 보니 여기 있었고, 있었으니 살아야 했고, 바스러지고 또 바스러지며 반듯하게 바로서는 방법을 찾았을 것이다. 그러느라 오늘도 마음 중심을 관통하여 등 뒤로 빠져나가는 바람을 붙잡지 않는다.
아름다운 풍경과 한 몸이 되면 마음도 맑아지는 것일까. 걸어온 사람마다 반가운 인사말을 건넨다. 금방 동화된 나는 낚싯대를 들고 다가오는 어느 가족에게 고기의 안부까지 묻는다. 그래서 대낮을 잃어버린 숲 속은 무서울 리 없는데, 우리는 간간이 흩어진 길을 찾느라 두리번거린다. 그 옛날 이 척박한 비렁에 길을 내며 걸어간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 길을 막고선 돌들을 한쪽 귀퉁이로 밀어낸 사람의 진심 어린 온기를 만진다.
어느덧 동생은 침묵이고, 나는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목을 축인다. 다행히 아기 마삭줄은 너무 해맑게 반짝이고, 우리의 빠른 호흡 속으로 푸른 산소방울이 울컥울컥 들어온다. 이 황홀한 길에도 거센 물줄기가 스친 자국이 보인다. 흙이란 흙은 모조라 휩쓸고 가버린 자리에 나무뿌리가 남루하다. 그래도 나무는 용케 살아서 그늘을 보태고 있다.
나이만큼 낡아버린 계단에는 수리할 예정이라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나부끼고 세월을 먹고 자란 나무들은 너무 빼곡하여 예전에 보았던 조망이 없다. 애초부터 모른다면 모를까 거기에 있을 거라고 믿은 것들을 찾을 수 없을 때, 움츠리고 있던 상실감은 고개를 들 수밖에...
갑자기 주위가 환하고, 등 뒤에선 환호성이 터진다. 주범은 유례를 알지 못해도 직감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선명한 이름, 통개다. 가만히 앉아 물멍을 해도 아깝지 않은 시간이 흐른다. 흐르고 흘러 바위에 멈춘 층나무꽃과 강아지풀의 조화에게 작별을 고한다. 그제야 건너편 바위들은 눈길을 마주친다. 항상 여기에 있을 테니 좋은 날 꼭 다시 오라고 손 흔든다.
숲의 적막이 길어지는 걱정도 숲을 빠져나오면 흔적이 없다. 문득 고개를 든다. 너무 파래서 시린 하늘을 떠받는 바위가 보이고, 바위에 기생하고 있는 부채손의 목마름이 보인다. 짧은 걸음이 모퉁이를 휘감고 도는 그늘에 한 가족인 듯한 분들이 쉬고 있다. 그 좁은 틈을 비집고 앞으로 나간다. 나무 데크가 보이고 더 이상 오르막이 없을 것 같은 매봉 전망대가 열린다. 세상은 온통 수평선 같은 평정이 반짝이고, 아찔한 절벽과 그 옛날 목숨을 걸고 땔감을 나르던 어린 넋들이 은빛 윤슬로 출렁인다.
민정바구, 둥굴바구, 덕석바구... 이름도 토속적인 바구들은 자연이 일궈낸 자태인데, 그 자연스러움이 오히려 인위적 의심을 일으킨다.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바다 감옥을 매일 바라보면서도, 절벽에 뿌리내린 가을꽃은 파리하게 말라가고 있다. 너무 넓어 가늠할 수 없는 거리가 보인다. 한나절 머물러 헝클어진 정신을 풀어내고 싶은 욕심이 요동친다. 우리는 마음 가는 데로 철퍼덕 주저앉아 보지만, 이내 가야 할 비렁 출렁다리가 올려다 보고 있다
어둠이 가득 고인 동백 숲은 바람을 많이 탔는지, 하나의 몸통으로 우뚝 서질 못하고 밑둥치부터 여러 갈래로 흩어졌다. 학동에서 오면 깔딱 고개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급한 내리막이다. 내리막은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은 여기서도 적중한다. 뒤따르던 조카가 쭈르륵 미끄러진다.
대낮을 완전히 가려버린 숲의 내부를 빠져나왔다는 안도가 비렁 출렁다리 전망대에 머문다. 거기에도 온통 칡넝쿨이다. 거센 바람에도 끄덕할 것 같지 않던 흔들림의 시작은 갠자굴의 장난이 아닐까. 이런 가벼운 농담도 다 받아줄 것 같은 갠자굴마저도 고독을 어쩌지 못해 제 속의 밑바닥을 못동마을까지 들키고 있다니... 갠자굴의 비명을 안다고 한들 못동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긴 세월 사나운 얼룩을 파내느라 아찔해진 갠자굴 속으로 무심한 파도는 또 한 무더기의 소란을 던지고 떠난다.
3.5km, 2시간이면 충분한 길을 우리는 무려 세 시간을 걸었다. 아니, 푹 담그고 왔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초고속에 익숙하느라 메마른 정신이 촉촉하게 젖을 수 있다면 하루를 걷는다고 아까울까. 학동으로 이어진 작은 다리를 건너며 뿌듯해진 동생과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내년엔 다음 길도 걸어보자고...
댓글목록
<span class="guest">선우향</span>님의 댓글
선우향 작성일
님의 글을 읽으며
고향이 저절로 떠올라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
몇줄 쓰다가 너무 힘들어 포기했습니다.
역시, 글은 아무나 쓰는게 아닌듯 하네요 ㅎ
그래도 마음은 다시 달려갑니다...
금오도로 향하며